설을 앞두고 ‘고부갈등’을 호소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많지만 최근엔 ‘장서(丈壻) 갈등’을 호소하는 사위도 적지 않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이혼남녀 532명(남녀 각 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25.2%가 ‘처가를 대할 때 부담스러웠다’고 답했다.
박소영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일 발표한 ‘사위가 경험하는 장서관계’ 논문에서 장서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결혼기간 5~16년인 사위 15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다. ‘백년손님’ ‘너는 내 아들’ ‘마당쇠’ ‘초대받지 않은 손님’ 유형이다. 박 교수는 “손주들의 육아를 돕는 장모가 늘고 남성들이 처가와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관계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위들이 결혼 전 가장 많이 예상하는 관계가 ‘백년손님’ 유형이다. 사위와 장모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경계선이 분명한 관계다. 조사 대상 15명 중 절반이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생각에 무조건 잘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갈등과 협력을 동반하는 관계가 더 많았다.
김정태(36)씨는 장모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너는 내 아들’ 유형이다. 김씨가 아내(36)와 크게 다퉜을 때 장모가 중재에 나서면서 신뢰가 쌓였다. 김씨는 “장모님이 ‘둘 다 잘한 것 없으니 술이라도 한잔하고 들어와라. 애는 내가 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마음의 벽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장모가 딸 부부의 관계에 깊이 개입하고 아내가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마당쇠’ 유형도 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유형이다. 박모(39)씨는 처가에서 늘 꿔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생각에 괴롭다. 박씨 부인은 딸만 넷인 딸부잣집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네 딸이 처가가 있는 서울 이촌동 근처에 모여 산다. 주말마다 가족 외식을 하고 1년에 두 번은 장인·장모, 처형 가족과 여행을 간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 박씨는 “처가 행사에 매주 불려 다닐 때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장모가 알게 모르게 변호사와 의사인 동서들과 비교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다.
장서관계가 다양해지고 갈등이 느는 것을 두고 엄명용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고부관계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장서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지홍 민들레가족상담센터장은 “엄마들은 ‘내 딸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사위가 딸에게 잘못하면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간섭하게 되고 사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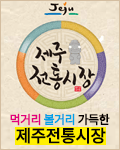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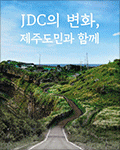






.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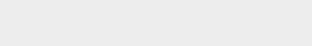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802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Tel: 064-745-9933, Fax: 064-744-9934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802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Tel: 064-745-9933, Fax: 064-744-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