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이금섬(92)씨는 북쪽에서 온 아들 리상철(71)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그는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가다 남편과 네 살배기 아들의 손을 놓쳤다. “아버지 모습입니다, 어머니.” 상철씨가 생전 아버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들은 남북처럼 분단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이 애석한 듯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애들은 몇이나 뒀니?” 구순이 넘은 노모는 평생 가슴에 품어온 궁금증을 속사포처럼 토해냈다. 두 손을 꼭 잡고 밀린 이야기를 나눴다. 야속한 시간은 빛처럼 흘렀다.
행사 첫날인 이날 남쪽 방문단 89가족 197명이 금강산을 찾았다. 100살을 눈앞에 둔 한신자(99)씨는 북녘에 두고 온 두 딸 김경실(72)·경영(71)씨를 만났다. 북에서 온 두 자매는 엄마가 다가오자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곤 눈물을 터뜨렸다. 말문이 막힌 한씨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전쟁 당시, 한씨는 갓 태어난 막내딸만 둘러업고 피난길에 올랐다. 다섯, 네 살 연년생 자매는 고모 집과 친정에 맡겼다. 두세 달이면 돌아올 줄 알았다. 자식을 졸지에 고아로 만들었다고 자책하다 잠 못 이룬 날을 헤아릴 수가 없다. 노환으로 귀가 잘 안 들린 지 10년이 넘었고, 백내장 탓에 눈이 침침하다. 그래도 두 딸의 목소리, 얼굴은 금세 알아봤다.

“봇짐 메고 학교 다닐 때” 헤어진 남쪽 김병오(88)씨와 북쪽 여동생 김순옥(81)씨는 전직 교사, 의사가 돼 다시 만났다. “상봉이 결정된 다음부터 날마다 잠을 하나도 못 잤다.” 오빠가 말했다. “오빠, 이거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 사진이다. 나 평양의대 졸업한 여의사야. 평양에서 정말 존경받고 살고 있어. 가스도 매달 주고.” 동생 순옥씨는 65년여 세월을 따라잡으려는 듯 쉴새없이 말을 건넸다. “여동생이 이렇게 잘됐다니 정말 영광이다. 나는 고등학교 선생님 30년 하고 교장으로 퇴직한 지 10여년 됐어.” 오빠와 동생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연신 웃었다. “혈육은 어디 못 가. 오빠랑 나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오빠 통일되면 정말 좋을 거야. 통일돼서 단 1분이라도 같이 살다 죽자 오빠.”
형 조정일(87)씨는 북녘의 막내동생 조정환(68)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월남한 가족이 찾으면 혹여 피해가 될까 걱정돼” 상봉을 신청할 엄두도 못 내던 그 동생의 “생사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했다. 정일씨가 이름을 지어준, 전쟁 나던 해 태어난 막내는 가족사진을 꺼냈다. 행여 세월에 바랠까 빳빳하게 코팅한 사진이었다. “나랑 닮았잖아. 내가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조씨는 사진을 이리 보고 저리 봤다.

남쪽 이산가족들은 이날 아침 8시35분께 버스 20여대에 나눠 타고 동해선 육로를 거쳐 금강산에 도착했다. 이후 단체상봉, 북쪽 주최 환영만찬에 참여했다. 만찬에서 남녘의 늙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자, 북녘 딸이 잽싸게 ‘닭튀기(튀김)’를 엄마 입에 넣어줬다. 형제들은 대동강 맥주를 담은 잔을 부딪쳤다. 21일에는 ‘개별상봉’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외금강호텔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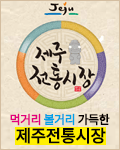










.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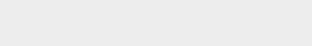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802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Tel: 064-745-9933, Fax: 064-744-9934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802호(노형동, 정한오피스텔) Tel: 064-745-9933, Fax: 064-744-9934